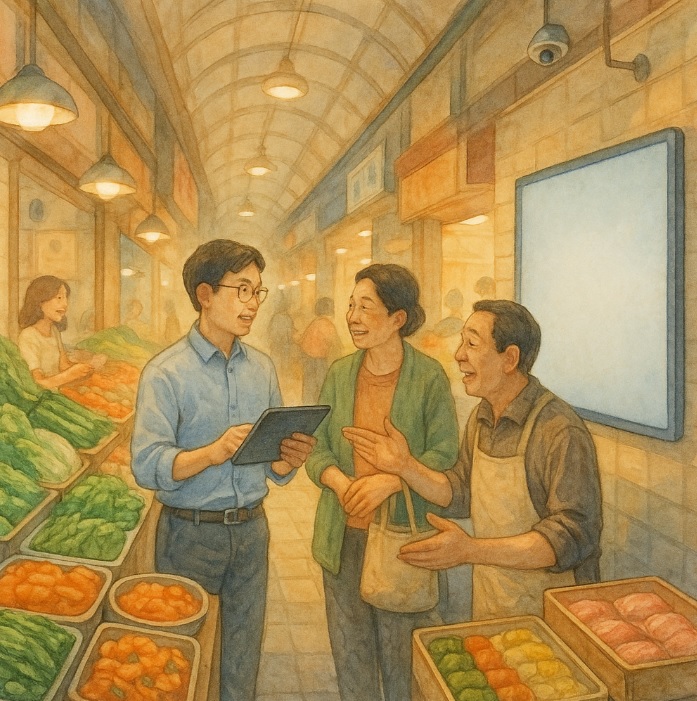
데이터가 시장에 들어오다
디지털 전환이 유통 전반을 뒤흔드는 시대에, 전통시장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운영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인의 감각과 경험에 의존해 상품을 배치하고 가격을 조정했지만, 이제는 고객의 유입 패턴과 체류 시간을 데이터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상권분석 서비스」를 통해 전통시장별 유동 인구와 카드 매출 데이터를 공개하며 상인 및 지자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2022). 이러한 변화는 전통시장이 ‘감의 경제’에서 ‘데이터 경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데이터 활용 — 시장의 흐름을 수치로 읽다
AI 고객 분석 시스템은 CCTV, Wi-Fi, IoT 센서, 결제 데이터 등을 통합 분석하여 고객 유입 경로와 체류 시간, 연령 분포를 도출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시장 운영의 근거로 활용되어 시간대별 유동인구 변화 및 매출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UNDP와 Kakao가 2024년에 발표한 공동 리포트 “The Need for Online Support to Enhance the Strengths of Traditional Markets in the ‘Offline’ Realm”에 따르면, 소상공인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맞춤 알림과 쿠폰 발송을 지원하는 디지털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시장 참여자의 이해도와 매출 반응이 확실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UNDP & Kakao”, 2024). 즉, AI 데이터 활용은 고객의 ‘보이지 않는 발걸음’을 숫자로 보여주는 도구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운영 효율 — 데이터가 만드는 스마트 상권
수집된 데이터는 전통시장의 운영 방식을 정밀하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마트상점 사업」은 AI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해 고객의 방문 패턴을 분석하고, 매출 데이터와 연계해 점포별 운영 효율을 평가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 이를 통해 유입이 적은 시간대에 인력을 조정하거나, 체류 시간이 긴 구역에 체험형 콘텐츠를 배치하는 전략이 실제 적용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 상권분석 데이터에서는 평일 오후 6시 이후 시장 유입량이 주말 대비 40% 이상 감소한다는 분석도 확인되며, 이는 영업시간 조정 및 야시장 운영 기획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2022). 이처럼 AI 분석은 시장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 최적화 — 감성과 데이터의 결합
AI 기술은 단순히 고객 수를 세는 도구가 아니라,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새로운 접점을 만듭니다. 고객의 연령대별 방문 비율 및 체류 패턴을 활용하면 특정 층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기획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층 유입이 많은 전통시장 구역에는 SNS 친화적 디저트 존을 조성하고, 여성 방문객 비율이 높은 시간대에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서적 소통’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전통시장에 도입하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UNDP & Kakao”, 2024). 다만,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해석 역량 부족 등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으며, 상인 교육 및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
AI가 비추는 시장의 미래
AI 고객 분석 시스템은 전통시장에 새로운 ‘눈’을 달아주는 기술입니다. 아직 대형 마트나 온라인 플랫폼에 비해 도입 속도는 느리지만, 데이터를 활용한 상권 운영과 정량적 정책 설계가 가능해지면서 전통시장도 ‘스마트 상권’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AI 분석과 스마트상점 인프라, 상인 교육이 연계되어야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이 정착될 것입니다. 기술의 궁극적인 가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AI가 시장 운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현명하게 고객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때 전통시장은 비로소 ‘디지털 시대의 생활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